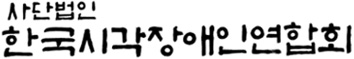그는 혼자 입장하지 못했다. 도우미의 팔을 잡고 나왔다. 명창 왼편에 놓인 방석에 앉을 때에도 손바닥으로 확인하며 앉아야 했다. 관람객들은 비로소 그가 시각장애인이란 것을 알고 숨을 죽였다. 왼손에 북을, 오른손엔 북채를 쥔 그는 고개를 창자(唱者) 쪽으로 향했다. 왼손에 잡았던 북은 몸쪽으로 끌어당겼다. 북 위치가 불안정했던지 북을 몇 번씩 돌리며 위치를 조정했다. 왼손 엄지를 북의 왼쪽에 걸쳤고 창자의 첫 소절을 기다렸다.
이윽고 흘러나오는 소리, 심청가였다. 그는 소리 하나하나를 감각적으로 느끼며 오른손의 북채로 장단을 맞췄다. 진양조와 중중모리, 자진모리와 중모리 장단이 뒤섞였다. 장단의 변주를 순간순간 감지하면서 악절의 시작과 가락 흐름에 따라 “얼씨구∼ 핫! 잘∼한다 얼씨구야!” 하는 추임새로 흥을 돋우었다. 창자와 눈을 마주칠 수는 없었지만 마음은 하나였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국립국악원에서 펼쳐진 ‘한국의 장단 찾기 한마당’ 예선에 출연한 국내 유일의 시각장애인 고수 조경곤(45·인천순복음교회)씨였다.
조씨가 이날 참가한 대회는 북을 사용한 고법(鼓法) 외에도 민속악 반주장단을 함께 심사했다. 고수가 북과 장구를 사용해 장단을 맞추는 대회였다. 총 60명이 참가했고 대부분 국악고나 국악 출신 전공자들이었다.
3시간을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기도와 연습을 반복한 그는 총 6분의 공연을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와 “장단이 뒤섞이고 박자가 요동쳤지만 놓치지 않았다. 하나님께 감사하다”며 흡족해했다.
대회는 사전에 창자와 연주자가 따로 만나 맞추지 않고 당일 즉석에서 소리와 연주에 맞춰 고수가 장단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비장애인은 소리꾼의 눈을 보며 장단을 맞출 수 있지만 조씨는 오로지 소리만 감지해야 했기에 10배는 힘들었다. 특히 창자가 2박, 4박, 12박 등으로 박자를 바꾸거나 장단을 옮길 때는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장단이 틀리거나 박자를 놓치면 그 자리에서 탈락하는 게 이 대회 규칙이었다.
그가 고수가 된 것은 15년 전이다. 고등학교 때 운동을 하다 다친 망막이 점점 시력을 잃어 20대 후반 완전히 실명한 뒤 고수가 되기로 결심했다. 인간문화재 김청만 선생을 사사했고 5회의 입상 경력도 있다. 안숙선 김수연 왕기철 등 당대 최고 명창과도 호흡을 맞췄다.
전북 김제가 고향인 그는 어릴 적부터 판소리와 국악을 들으며 자랐다. “소리꾼의 소리보다 고수가 좋았어요. 고수의 장단과 추임새, 흥에 따라 소리가 달라집니다. 고수는 강을 사이에 두고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배와 같아요. 명창의 기량이 80이라면 고수는 100까지 끌어올려주지요.”
조씨에 따르면 판소리에서 고수의 구실은 명창 못지않게 중요해 예부터 ‘일고수 이명창(一鼓手 二名唱)’ 또는 ‘수(雄)고수 암(雌)명창’이란 말로 표현했다 한다.
그는 이날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고 했다. 박자를 틀리지 않았고 기량을 충분히 발휘했기 때문이다. 그는 “참가한 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악 선교를 꿈꾸고 있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그의 얼굴은 밝았다. 자신이 입고 출연했던 연분홍 한복 두루마기 색깔처럼.
신상목 기자 sm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