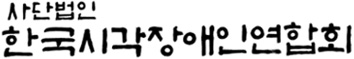서울시 문예프로그램 ‘마음에 文…’ 등단 꿈 키우는 김혜란-김선미 씨

앞은 잘 보이지 않아도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시를 써내려 가는 김혜란(위 사진 왼쪽), 김선미씨가 문예창작 프로그램 ‘마음에 문(文)을 열다’ 수업을 듣기 위해 점자 보도블록을 따라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각자 쓴 시가 적힌 점자책을 손으로 읽고 있다(아래 사진). 이종승 기자 urisesang@donga.com
“다음은 ‘가을 여행’이라는 시입니다. 작가께서 읽어보시죠.”
지난달 21일 오전 11시 서울 성북구 동선동4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여성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예창작 프로그램 ‘마음에 문(文)을 열다’ 심화반 수업이 있는 날이다. 검은 선글라스를 낀 시각장애 1급 김혜란 씨(62·서울 강서구 화곡동)는 올록볼록 튀어나온 점자책을 더듬으며 낭독을 시작했다.
‘가을 풍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자/세월에 찢겨 흩어진 나의 조각을 찾아봐야지/내 목소리와 손끝이 닿지 않는 나의 별에게는/뼈 조각 하나 떼어내서/ 피 한 방울 찍어 엽서에 곱게 적어 보내고….’
○ 삶의 이야기를 ‘점자’로 써내는 사람들
“제 딸을 생각하며 썼어요. 그 아이와 가을 여행 같이 가보는 게 소원이었는데….”
열일곱 살 때 ‘녹내장’으로 완전히 시력을 잃은 김 씨. 화가가 되고 싶었던 그에게 녹내장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고향을 떠나 서울 한빛맹학교로 전학했다. 안마 기술을 배운 그는 졸업 후 안마시술소에 취직했다. 그 즈음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다. 볼 수는 없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쁠 것이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다.
하지만 세상은 끝까지 야속했다. 유일한 피붙이였던 딸이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그때부터 김 씨는 점자로 매일 글을 썼다. 딸이 보고 싶을 때 낙서하듯 자신의 감정을 글로 다스렸다. 점자책이 없으면 휴대전화에 녹음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마음에 문(文)을 열다’ 수업을 알게 됐다. 그는 ‘가을 여행’에 대해 “뼈 조각을 떼어내도, 피를 나눠도 아깝지 않을 딸에게 보내는 한 편의 엽서”라고 말했다.
○ “더 이상 삶을 원망하지 않겠다”
‘마음에 문(文)을 열다’는 문학과 예술에 관심이 많은 여성 시각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서울시가 올해 처음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하반기 프로그램(4개 수업)에 참여하는 여성 시각장애인은 총 19명. 김 씨를 포함해 수강생 대부분은 문학계 ‘등단’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반기 참여자 중 8명은 ‘장애인문학상’에 공모해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이야기한다. 역경을 딛고 살아가는 모습부터 가족에 대한 그리움,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시에 담아내고 있다.
시각장애 5급인 김선미 씨(34)는 “시를 쓰는 것은 스스로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10년 전 결혼 후 아이를 낳을 때까지도 시각장애를 가졌는지 몰랐다. “딸 눈이 하얗다”며 병원에 가보라는 친척의 말에 그는 동네 안과에 가서야 선천성 백내장, 각막혼탁, 안구진탕 등의 증세가 있다는 걸 알았다. 이 과정에서 딸은 1급, 자신은 5급 장애 판정을 받았다. 슬픔에 지칠 때쯤 김 씨는 우연히 안과에 걸린 글쓰기 공모전 공고를 봤다. 남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의 얘기를 덤덤하게 써보고 싶었다. 스스로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눈에는 마치 기어가는 것 같은 모습을 ‘달팽이’에 비유했다. 그는 장려상을 받았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던 삶의 고통을 함께 공감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다. 그 이후로 그는 삶의 이야기를 담은 시와 수필을 컴퓨터로 낙서하듯 썼다. ‘매미 따라 울고 싶다’는 시도 그중 하나다.
‘시간이 녹아 버리지 않는 한/대신할 수 없는 두 아이의 시각 장애와/피할 수 없는 유전과 가난은/날려 보내지 못한다는 것을/당신은 아십니까?’
그는 아이들을 보면 막막해 매미처럼 한없이 소리 내어 울고 싶었다. 하지만 “글을 쓴 후부터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로 했다”며 “내 글을 통해 다른 사람들도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